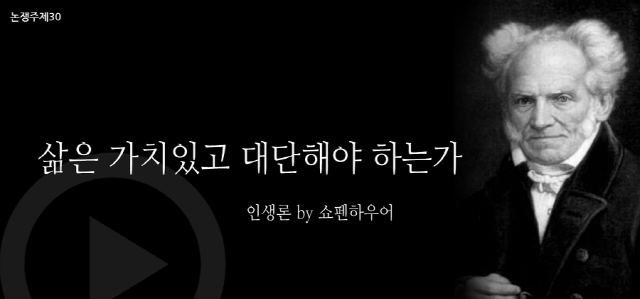"인간은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
쇼펜하우어는 19세기 초반 독일 철학계의 주류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우상 이마누엘 칸트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지만, 현실이 근본적으로 비물질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동시대 관념론자들을 무시했다.
그는 특히 관렴론자 게오르크 헤겔의 딱딱한 문체와 낙관적 철학을 혐오했다.
칸트의 형이상학을 출발점으로 삼은 쇼펜하우어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발전시켜 명쾌한 문학적 언어로 표현해냈다.
그는 세계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현상)과 물자체(본체)로 나뉜다는 칸트의 견해를 수용했지만, 현상계와 본체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싶어했다.
칸트철학 해석
칸트에 따르면 우리는 저마다 지각한 바를 토대로 자신만의 세계를 짜 맞추지만, 있는 그대로의 본체계 '자체'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다.
즉 우리는 모두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지각으로 얻는 지식은 한정된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다음을 덧붙인다.
"인간은 자기 시야의 한계를 세계의 한계로 믿는다"
지식이 우리 경험에 국한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은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도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 믿는다"라고 말했다, 17세기에 존 로크도 "어느 누구의 지식도 자기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이유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칸트의 현상계와 본체계에 대한 해석에서 도출된다.
칸트와 쇼펜하우어의 중요한 차이점은 쇼펜하우어에게 현상계와 본체계란, 별개의 두 현실(세계)이 아니라 다르게 경험되는 같은 세계라는데 있다.
그것은 '의지'와 '표상'이라는 두 측면을 갖춘 하나의 세계다.
이는 우리 몸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몸을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한다.
즉 그것을 대상(표상)으로서 지각하는가 하면 내부(의지)에서도 경험한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의지의 작용(내 팡을 올리고 싶은 바람 등)과 그에 따르는 운동은 별개의 두 세계(본 체개와 현상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는 같은 사건이다.
하나는 내부에서 경험되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관찰된다.
자기 외부의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록 그것의 내적 현실(의지)이 아닌 객관적 표상만을 볼 뿐이지만, 세계 전체는 여전히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우주의 의지
쇼펜하우어가 '의지'라고 표현하는 순수한 기운은 진행방향은 딱히 없으나 현상계의 모든 일을 일으킨다.
칸트와 마찬가지로 그는 공간과 시간은 우리 마음속의 개념이지 마음 밖의 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세계의 의지는 시간을 보내지도 인과적-공간적 법칙을 따르지도 않는다.
이 말은 곧 세계의 의지란 시간을 초월하고 분할 가능하며 우리 개인의 의지 또한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결국 우주의 의지와 개인의 의지는 동일하고 현상계는 거대한 초시간적-맹목적 의지에 지배되는 셈이다.
동양에서 받은 영향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드러난다.
헤겔 같은 동시대인들의 의지를 긍정적 힘으로 여기는 반면,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우주의 맹목적 의지에 휘둘린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의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뒤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망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기에 세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무의미하며,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만족감을, 최악의 경우 고통을 얻게 된다.
그는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비참한 생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비존재가 되거나 적어도 만족을 좆는 의지를 줄이는 것뿐이다.
그는 심미적 관조, 특히 음악으로 현상계를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의 열반(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난 초월적 상태)개념을 상기시킨다.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그의 사상과 불교의 유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동양의 사상가와 종교를 깊이 연구했다.
유일한 우주의지 개념에서 쇼펜하우어는 윤리학을 발전시킨다.
그가 다른 부분에서 염세적-비관적 기질을 보였음을 고려할때 이 윤리학은 다소 놀랍기도 하다.
그가 깨달은 바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과 우주가 본질적으로 별개라는 생각이 오해임을 깨달을 경우(개인의 의지와 우주의 의지는 동일하므로)나머지 사람 및 사물 모두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럴 경우 도덕적 선이 보편적 동정심에서 생겨날 것이다.
여기서도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동양철학의 이상을 반영한다.
후대에 남긴 유산
쇼펜하우어는 당대의 독일 철학자들 대다수에게 무시당했고 그의 사상은 헤겔사상의 그늘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여러 작가와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에는 그가 의지에 부여한 중요성이 또 다시 철학계의 화두가 되기도 했다.
예컨데 프리드리히 니체도 쇼펜하우어에게 받은 영향을 인전했고, 앙리 베르그송과 미국 실용주의자들 또한 세계를 의지로 본 그의 분석에 신세를 졌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야는 심리학일 것이다.
그 분야에서 기본적 욕구와 욕구불만에 관한 그의 견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카를 융의 정신분석학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